“당신의 자녀에게 농촌에서 농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농업과 농촌 문제의 해결정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젊은이들이 농업을 업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 농촌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거꾸로 당신이 제시한 해법이 진정 우리가 우려하는 농촌 소멸을 막고 농업인들이 활기차게 농사일을 하는데 합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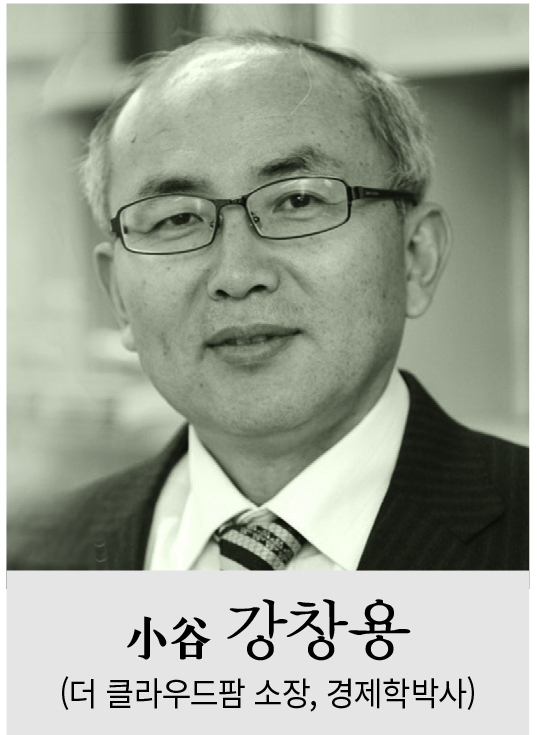 “농촌이 사라진다.” “지역이 소멸한다.”는 말은 꽤 오랫동안 회자되어온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기미는 보인다 해도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離村向都)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부터라고 봐야 한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쪽으로 움직인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며, 우리 모두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좋다고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사람이 떠난 곳은 항상 황폐화하기 마련이다.
“농촌이 사라진다.” “지역이 소멸한다.”는 말은 꽤 오랫동안 회자되어온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기미는 보인다 해도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離村向都)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부터라고 봐야 한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쪽으로 움직인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며, 우리 모두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좋다고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사람이 떠난 곳은 항상 황폐화하기 마련이다.
결국 지금의 결과는, 출발이야 어찌 되었든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당초에 기대했든, 하지 않았든지 그 결과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원천적인 이유를, 시대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를 양산할 때, 2차 산업의 중흥을 추진할 때, 지금의 기후문제를 누군들 생각했겠는가. 설령 어느 정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지경이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1980년대 일본에서 불기 시작한 정주권 개발계획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었었다. 그 맥락이 지금의 지역종합개발계획과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농업과 농촌을 시장 경제에 맡길 경우, 지금에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골자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받아들여서 농촌 정주권 개발계획을 세우곤 하였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여전히 지역소멸, 노령화 심화, 빈곤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누구라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면 당연히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 물질과 정신,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이 종합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곳에 모인다. 그러한 변화 내지는 이동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추종유발 요소를 강하게 하면, 농촌에도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귀농과 귀촌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의 전개로부터 유인된다. 말만 무성한, 지역이 소멸한다는 난리법석에 대한 해결할 기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매번 농촌개발 관련 사람들은 삶의 질 만족도 조사결과의 수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좋아졌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곳의 늙은이들의 생각과 도시 젊은이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삶의 만족도가 도시와 비슷한데 왜 떠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그러니 제시하는 방책은 현장과 괴리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목표는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만족하는 수준이 도시 젊은이들 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숫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삶을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과가 여전한 농촌소멸을 보인다면, 그동안의 백가지 정책이 무효였던 셈이다. 물경 30~40년에 걸친 지역개발, 농촌공간 살리기 정책들의 결과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재론컨대 정책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들의 세상살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 표피의 모습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마음을 읽어야 한다. 진정 농업과 농촌에 대한 참여와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정책, 그것이 핵심이다.
미래 젊은이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지, 물질적, 정신적 풍요 요소는 무엇인지 숙고해 봐야한다.
‘삶의 질’ 그것은 세대 따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복잡한 희망의 잣대와 생각을 어떻게 만족으로 채울지 혁신적 사고로 대응해야 할 시대이다. 그래야 농촌소멸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정책의 요체는 바른 것(正)이라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