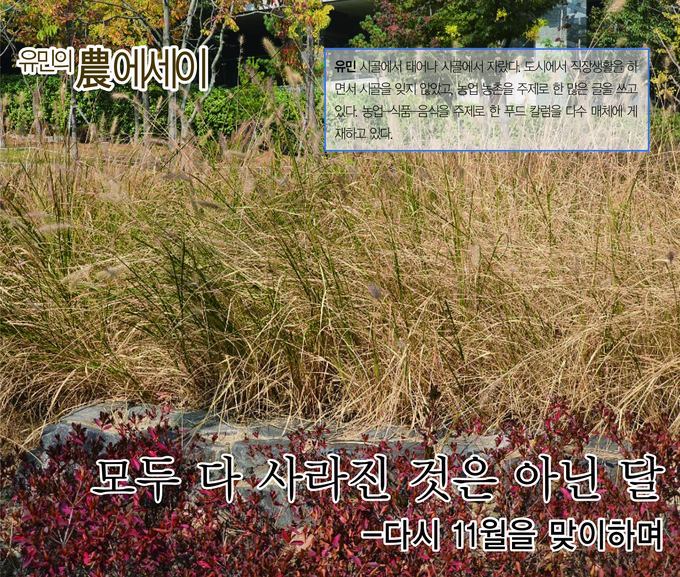
어릴 적부터 11월을 좋아하지 않았다.
첫째 이유는, 공휴일이 없는 유일한 달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이유는, 그 좋던 가을날이 다 가고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왠지 모르게 난데없는 추위가 늘 11월에 찾아왔다. 전보처럼.
셋째 이유는, 제대로 한 것도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바로 그 달이면 오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12월이 아닌 11월에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넷째 이유는, 1이란 숫자가 나란히 서서 압박하는 듯한 기분 탓도 있었다. 1등에 얽매여 살아온, 도무지 1등을 할 수 없는 처지들의 콤플렉스가 11월에 발동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다섯째 이유는, 영단어 November가 애꿎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 2, 3, 4, 5월의 영단어는 잘 외워졌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 외우기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10, 11, 12월이 어려웠다. 9월(September)과 12월(December)도 헷갈렸는데 그 사이에 11월이 (휴일도 없는 주제에) 끼어 있으니 공연히 더 미웠다. 급기야, 오죽하면 No로 시작할까 하는 11월 암기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미워할 이유는 많았다. 11월에 사랑하던 연인이 떠났고, 11월에 자전거를 타다 팔이 부러졌고, 왠지 11월의 옷값은 더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등등의 하찮은 이유들 말이다.
하여간 11월은 스산하다.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영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을 안고 살다가 어느 시인이 쓴 (11월의 시가 아니라) 두 개의 메시지를 접했다.
첫째는 시인의 손자가 가르쳐준 영감이다. 이런 대화가 실려 있는 시다.
“오늘은 학원에서 뭘 배웠니?”
“네, 오늘은 낙법을 배웠어요.” (시인의 손자는 유도 학원을 다녔다).
“그래? 낙법이 뭐냐?”
“잘 넘어지는 법이에요.”
“넘어지는 법?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웠다고?”
“네, 학원에서 내내 넘어지는 연습만 하고 왔어요.”
“세상에,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잘 일어서는 법, 잘 달리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는데 너는 넘어지는 법을 배웠구나.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그 후 이 시인은 과일나무를 보고 더 놀라운 의문을 가졌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과일은 한결같이 둥글까. 세모나 네모나 육각형이 아니고 모든 과일이 둥글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살았다니, 시인은 놀랐고 무서웠다.
그리고 또 알게 됐다. 열매는 둥글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줄기와 가지, 뿌리는 뾰족하다는 것을. 둥근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뾰족이들이 끝없이 뚫고 뻗고 솟는다는 것을 늘그막에 깨달은 것이다. 그가 깨달은 사실이 시란 형태로 내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11월을 다시 새기게 되었다. 1자가 쌍으로 뻗쳐 있는 것도 궁근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은 아닐지. 11월은, 아직도 한 달의 여유가 남아 있음을 알리는 속삭임은 아닐지.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를 말하는 유일한 달은 아닌지.
11월의 추위와 스산한 낙엽을 맞이하며 이제라도 이 달을 좋아하는 이유들을 찾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