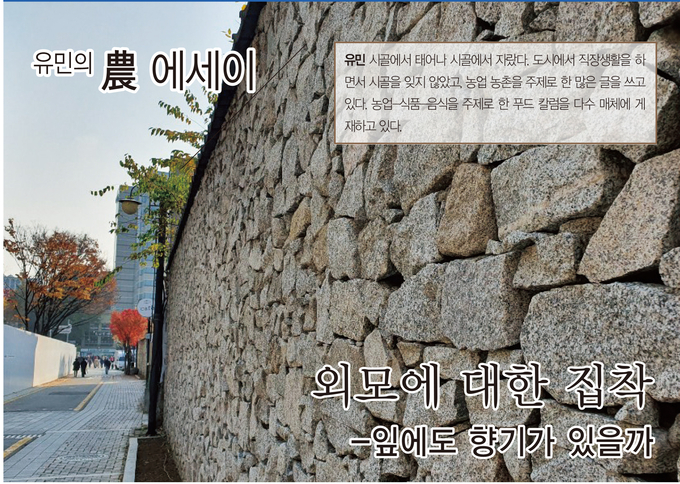
#1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던 (지금도 잘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때, 새벽 산책을 하던 늦봄의 기억이 난다. 천변을 걷다가 둑방 밑으로 옹기종기 피어난 노란색 꽃향기를 맡고 있는데 지나던 노인이 다가왔다. 노인은 내 옆에서 이슬에 맺힌 풀잎을 툭툭 털더니 코끝에 갖다 댔다. 잎에도 향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읽었는지 노인이 말했다.
“새벽이슬 머금은 잎 향기는 보약보다 좋은 걸세.”
마치 도인처럼 한마디 던지고는 휙휙 걸어갔다.
이상하게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그날의 기억은 반복해 떠오른다. 가끔 새벽 산책을 나가게 되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른다. 노인 때문일까, 향기 때문일까.
#2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엇비슷하게 맞아간다고 믿고 있던 30대 때, 시골에 사는 기타리스트를 만난 적이 있다. 제법 긴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며 음악과 시골의 궁합에 대한 얘기를 듣고 헤어질 무렵이었다. 읍내에 함께 나와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은행엘 같이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CD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일을 처리해야 했다. 창구 직원과 뭔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타리스트가 창구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정중했지만 은행 전반을 휘감았다. 창구 안쪽에서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고, ‘무슨 일인지’를 물었고, 다시 시간은 흘러갔다.
얼마 뒤 우리는 은행 밖으로 나와 아무 일 없던 듯이 인사하고 헤어졌다. 대단한 사건이랄 것도 아니었는데 오래도록 그날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드물고, 과거처럼 시끌시끌한 다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나지막하게, 그러나 무게 있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들을 환경도 사라진 게 사실이다.
#3
Gaudi라는 ID를 쓰는 후배가 있다. 건축가 가우디의 이름이다. 그래서 물었다. “가우디가 그렇게 좋냐?” 후배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본받고 싶은 점이 있어서요.”
스페인, 특히 바르셀로나 근처로 여행을 다녀오면 대개 가우디의 팬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배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죽음이 너무 슬퍼요.”
위대한 건축가로 존경받던 안토니 가우디는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전차 운전사는 가우디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노숙자로 생각해 슬그머니 치워놓고 (승객들을 위해) 계속 차를 몰았다. 쓰러져 있는 그를 행인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려고 택시를 잡았다. 택시들 몇몇이 승차 거부를 했다. 겨우겨우 한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들에서도 (행색이 남루한 남자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시립 빈민 치료소까지 갔고, 거기에서도 한쪽에 밀쳐져 있을 때 신분이 밝혀졌다. 가족들이 부랴부랴 큰 병원으로 옮기려 하자 가우디가 말했다.“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지 않다.”
그는 결국 빈민 치료소에서 이 세상과 하직했다. 전차 운전사, 택시 기사, 그를 거부한 병원들이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세는 사라지지 않았다. 도시에 살수록 그 편견은 거세며 그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