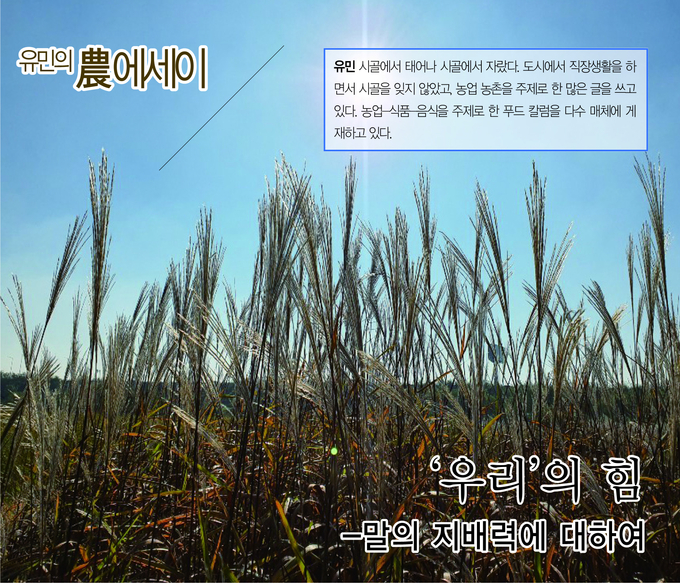
#1
며칠 전 아침 방송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바이오 회사 대표가 나왔다. 머잖아 백신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고, 이런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인터뷰 말미에 그의 개인사가 짧게 언급되었다(40대에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흙수저 출신인 그가 주식 부자 1위가 된 배경). 방송 종료를 알리는 시그널과 함께 희미해져 간 대화를 추려 담으면 이런 내용이다.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인들과 일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뛰어난 점은 많지만 특히 우리란 말에 익숙해요. 우리 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일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요.”
그의 이 말은 어떤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상황, 물량과 가격과 출시 시점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해한다. 뭐, 듣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초점이 다르니까.
#2
여전히 시골에 남아 있기를 고집하는 노모를 뵈러 갔다가 친구와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고향 왔으면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지,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미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술상 차릴게.”
부랴부랴 술상을 차리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우리 집이라니. 떠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그 말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 어머니, 이웃들. 우리란 말은 단어가 아니라 자연이다.
우리들 태반은 형제가 여럿이고 한 집에서 여럿이 살았다. 마을은 우리 동네였고, 집은 우리 집이었고, 학교는 우리 학교였다. 엄마도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였고, 형과 누이도 우리 형, 우리 누이로 공동 소유가 되었다. 의아한 것은, 형제가 없이 외동으로 자란 이들이 태반인 21세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엄마’,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집’이라고 말한다. 우리 엄마라 말하고 my mom이라 번역한다. our mom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이다.
#3
종종 ‘저희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종종보다 훨씬 자주일지도 모른다. 황급히 ‘우리나라’라고 고쳐 말하면 그나마 편해지는데, 저희를 반복하는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의 맥락을 놓치게 된다. 바로잡아 주자니 상대가 민망해 할 것 같고, 지나치자니 자리가 불편해지고… 게다가 그런 이들의 공통점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데 있으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로 비친다는 말은 자제하고, 같은 나라 사람끼리 ‘저희 나라’라 말하는 것은 어법의 오류라는 말도 자제하고, 오늘은 ‘우리’의 가치만 재조명하기로 작심한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힘이 있다. 우리라는 말도 의외로 힘이 세다. 그러니 우리의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소유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내꼬야”라고 외치고 빼앗기보다 “우리”라는 말을 앞세우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