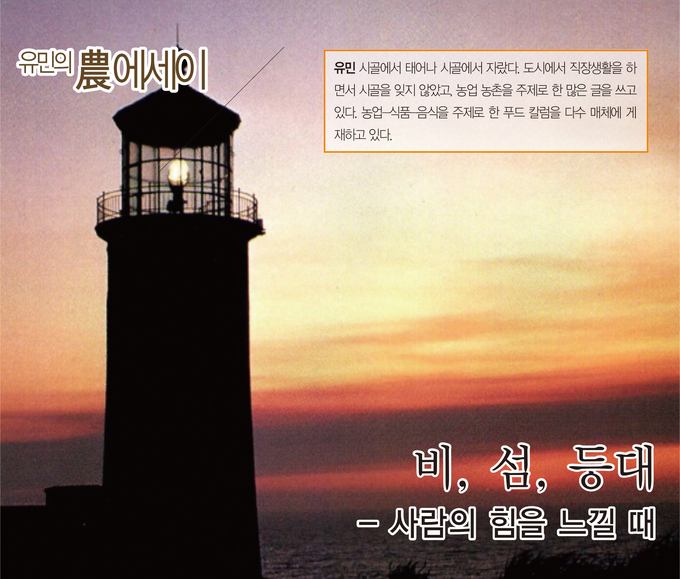
서해 끝 백령도에서 일주일 간 머물렀던 기억이 난다. 지치지 않고 내리는 장맛비가 백령도의 추억을 소환했다. 원래는 1박2일 일정의 출장이었는데 날씨가 발을 묶어, 본의 아닌 나 홀로 휴가를 섬에서 보내게 된 과정부터 보고한다.
출장 전 백령도 이장님과 통화한 내용이다.
“0월 0일 들어가서 다음날 돌아올 계획입니다.”“그렇게는 안될 거여. 그날 들어오면 열흘은 못 나간다 생각해.”
“일기예보 확인했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듯하고, 저희 일정이 좀 급해서요.”
“일기예보보다 내가 정확해. 하튼 알아서 하시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큰소릴 치시나. 동떨어진 섬에서 오래 사신 까닭에 과학의 발전을 여전히 하찮게 여기나 보다 싶었다. 나는 며칠 뒤 출장을 강행했고 사람보다 과학을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입도했을 때만 해도 멀쩡하던 날씨가 밤부터 심상찮게 바뀌더니 일주일 내내 비바람이 몰아쳤다. 역시 기상청보다 이장님이었다. 그때 이장님의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바다 날씨는 뭍과 달라.”
백령도에는 오래된 등대가 있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래된 이름만 등대인 등대처였다. 하긴 모든 배들이 GPS로 움직이는 시대에 등대의 역할이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이장님이 한마디 툭 던졌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 등대는 등대고 GPS는 GPS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성철 스님의 설법 같은 말이었다.
등대는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이건 그야말로 간단한 인식이다. 그것뿐이라면 GPS가 이미 대체하고도 남는다. 등대는 첨단과학이 못 미치는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다. 항구 인근 바다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등대에서 (약속된) 신호를 보낸다. 등대의 색깔이나 불빛 외에도 소리를 통한 소통도 하고, 국토 소유권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 있다. 장기간 외항에 나섰다가 귀항할 때, 등대가 보이는 순간의 감정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전달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그것, 등대는 표시나 기준이 아니라 뜨거운 숨결이라고 한다. 첨단의 전자 항해 기구들과 전혀 다른 완전한 생명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육지에 다다른 것을 전자 기기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해도, 등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에 훅 불이 당겨진다고나 할까. 아무리 낡고 헐고 기능이 멈춘 등대조차도 모성의 냄새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업은 날씨를 숙명으로 안고 가는 업이다.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기기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한다 해도 날씨와 자연의 변수를 이길 수는 없다. 결국은 사람이 그 변수들에 적응하고 조화시키며 결실을 만들어내야 한다. 해마다 겪는 장마와 태풍의 변수에 대해, 위력적인 첨단과학을 총동원하고도 당황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참고로 백령도 등대의 활동이 정지된 배경은 북한의 간첩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있었다. 2020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