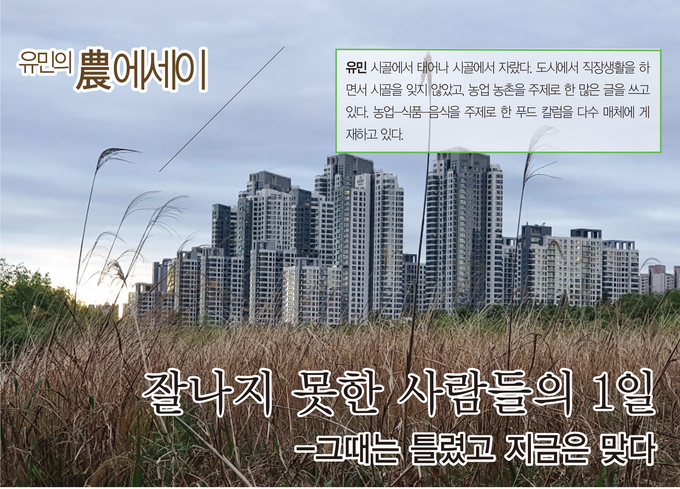
첨단 과학이 더 첨단화되어 가고, 인공지능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는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름 붙여진 정체모를 바이러스는 세계의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중이다. 현재의 국가별 경계와 체계는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 놓은 (일시적) 구도다.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고, 승전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들이 이리저리 판을 짠 10여 년을 감안하면 70년 정도 유지된 구도.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간 정도다.
1935년생인 필자의 모친은 일본어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 해방을 맞았고 10대에는 남북한 전쟁을 겪었다. 연애 한번 못하고 결혼한 뒤에는 자식들과 어떻게든 살아남는 데 인생을 걸어야 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의와 불의는 어떻게 나뉘고, 삶의 질이 무엇인지 따져볼 겨를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돈이 좀 있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미래를 짐작하며 갖가지 대비와 그에 맞는 지혜를 갖추곤 했다. 돈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두 방식 중 하나로 살아야 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생존에 집중하는 방식이고(나의 모친이 취한 방식인데 솔직히 동물들의 생존방식과 다를 게 없다), 하나는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기대어 나름대로 미래를 개척하는 방식이다.
요즘은 잘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지만, 잘나 보이는 사람과 잘난 사람을 도무지 구분하기 힘들고, 잘난 사람들의 말조차 옳다는 보장도 없다. 1935년에 태어난 여성의 동물적 생존방식과 2000년 이후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들의 선택적 인생 방식이 그다지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을 부정하는 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들의 몇 가지 주장들을 제시한다.
《인구폭탄(1968)》이라는 책이 있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곤충학자 폴 에를리히 교수가 쓴 책이다. 1970~1980년대에 세계에서 수억 명이 아사할 것이며, 세계 인구는 20억 명으로 줄어들 것(당시 세계 인구는 35억여 명)이라고 예측했다.
‘기근, 1975!’라는 책도 있었다. 미국의 잘난 형제 학자(윌리엄 패독과 폴 패독)가 1967년에 펴냈는데, 1975년 경 기아 대재앙이 세계에 닥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게 되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시의 잘난 이들 대부분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못난 국가 중 한 곳인 한국도 잘난 이들이 나서 산아제한을 시도, 인구 줄이기에 올인했다.
이제 와 돌아보면 잘못된 예측들이 너무 많았다. 농업에 국한해 보면, 비료와 농약, 농기계, 종자 개량 등 식량증산 효과를 가볍게 봤기 때문이다. 지금의 풍성한 식량 수급 상황을 당시의 지식인들이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요즘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오로지 생존 본능으로 살아온 1935년생 모친도 국민재난기금을 받은 뒤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돈을 “빨리 써야 한다”는 강박증을 보였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즐기겠다는 심리는 잠재된 불안 의식의 발현으로 보였다. 물론, 8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마운 나라’의 느낌을 당장 느끼고 싶어서일 수도 있었다. 아들은 노모에게 잘나 보이는 예측을 전하며 생존욕구를 부추겼다.
“지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우리가 승전국이 될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새로운 강국이 되어 잘사는 나라가 될 테니 오래오래 사세요.”
노모가 그 말을 믿을 리는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네 생활고는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칙 속에서 당신의 하루 안도를 바랄 뿐이다. 그야말로, 잘난 이들이 배우면 좋을 놀라운 지혜 아닌가.
